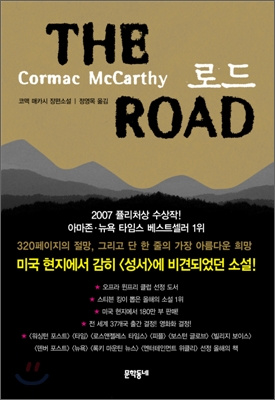
* 로드
* 코멕 메카시, 정영목 역, 문학동네
요즘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시사IN>에 광고가 나오기에 유심히 봤던 소설.
미국에서 <성서>에 비견됐다는 둥 하도 극찬을 하기에,
또 고등학교 시절,
퓰리처상 수상작이라기에 읽었던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별다른 감동을 받지 못했던 터라 큰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그런 내 기억은 너무 어렸기에 잘 이해를 못해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서점에서 몇 페이지를 넘겨 보았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마치 선문답을 나누는 것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 <성서>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른 구입하였다.
큰 이야기의 틀은 익히 알려져있듯
핵전쟁 이 후 살아남은 부자가 어딘가에 있을 인간들의 정착촌을 찾아 바다를 향해가는 여정.
물론 이들 부자만이 살아 남은 건 아니어서,
그 길고 지루한 여정 속에서 몇몇 인간의 무리들을 만나지만,
이미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고 그저 생존의 욕구에 지배당한 짐승과 같은 무리들.
아버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옆의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다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약속하고, 또 미안해 하고,
아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두려워하고,
이 소설의 본질은 어쩌면
아들의 질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주위의 다른 생존자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바뀌어 가는데,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 어긋나게
길가의 노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길 잃은 개를 데려갈려고 하고,
식량으로 포획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길 바라는 아들의 모습.
그런 아들의 한 마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불을 운반하니까요."
끊임없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인간임을 상기 시켜준다.
결국,
인간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신의 존재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에서
불을 운반하는,
그리하여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희망의 불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아이는 다름아닌 신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대화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난 오랫동안 불을 보지 못했소. 그뿐이오. 나는 짐승처럼 살고 있소. 내가 뭘 먹고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거요. 저 아이를 봤을 때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소."
"천사인 줄 아셨나요?"
"뭔지는 몰랐소. 그냥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저 아이가 신이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그런 건 다 넘어섰소. 오래 있었거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신도 살 수 없오. 당신도 알게 될거요....."
"저 아이한테 감사 해야 합니다. 나라면 아무것도 안 드렸을 테니까요."
"감사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어째서 안 한다는 거죠?"
"나 같으면 저 아이한테 내 걸 안 줬을 거요."
"저 애가 상처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저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아니오. 그 말을 들으려고 준 건 아니니까요."
"그럼 왜 준거요?"
남자는 소년을 건너다보다니 다시 노인을 보았다.
"어르신은 이해 못할 겁니다. 사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을 믿는지도 모르지."
"저애가 뭘 믿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일 수는 없겠지만,
여기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묵시록적인 분위기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책 표지에 쓰여있는 것처럼 320페이지의 절망, 그리고 단 한 줄의 가장 아름다운 희망 을
느끼진 못했다.
911사태 이 후,
다소 소심해진 미국인들이 불안한 자신들의 미래와 경제적 침체 상황 속에서 느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자화상 속에서 어떤 계시록적인 희망을 찾고자 했던 건 아닐까.

댓글을 달아 주세요